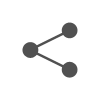6월 15일은 서해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9년 6월 서해연평도 앞바다는 연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한군이 우리 군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긴장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해 6월 6일 현충일에도 북한경비정이 꽃게잡이 명분으로 NLL을 침범해와 해군이 교전규칙에 따라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사격을 하고 우리 초계정과 함정이 작전기동을 하자 물러났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6월 10일에서 12일 까지는 긴장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9일부터 북한은 경비정을 10척으로 증강하였고 어뢰정을 추가하여 편대를 구성하면서 NLL을 7~13.7㎞까지 침범하였다. 이에 우리 해군은 초계함 2척, 고속정 5개 편대를 현장에 투입하였다. 6월 11일은 북한 경비정 4척이 NLL을 13.9㎞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에 충돌을 시도하자, 우리 해군은 이에 맞대응하여 선체 후미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작전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형 경비정 2척 대파, 2척이 크게 손상을 입은 반면 남한 고속정 4척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그 후 6월 15일 오전 8시 45분, 북한 경비정 4척이 다시 NLL을 침범하여 우리군의 고속정에 충돌을 시도하였고 오전 9시 28분에는 어뢰정 3척을 포함한 7척의 북한 함정이 우리 NLL을 침범하였다. 이에 우리 고속정 6척이 맞대응하여 ‘배치기식’ 작전을 시도하자 북한 경비정에서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25mm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교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우리 해군 장병들은 NLL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40㎜와 76㎜ 기관포로 응사하여 북한 어뢰정에 명중하면서 북한 어뢰정 1척이 검은 연기에 휩싸여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 했다. 교전이 일어난 지 14분여 만에 북한 함정 중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대형 경비정 1척을 대파했으며 중형 경비정 2척 반파, 소형 경비정 2척 파손이라는 전과를 올리고 북한이 퇴각하여 교전은 끝이 났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3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70여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전과정에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과 1척의 초계함이 기관실 및 선체 일부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우리 해군은 생명선인 NLL을 끝까지 사수해 냈다.
전투가 끝나고 그해 7월 정부는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고속정편대장 최용규 소령 등 7명의 유공 장병을 1계급씩 특진시키고 안지영 대위 등 50명에게 훈 포장을 수여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전승기념비도 세웠다.
이 교전은 6.25전쟁 이후 우리 군이 북한 정규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유일한 전투다. 혹자는 이를 대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6월 15일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승전기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북정책이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 기조로 이어져 오면서 승리를 승리라고 말 할 수 없는 분위기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제1연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호국용사들은 정부행사에 초청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 승전기념행사도 2함대사령부만의 부대행사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 이었다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남겨진 보훈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라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데 제1연평해전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정부가 제1연평해전을 지난 24년 동안은 북한을 자극 할까 염려스러워 소극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국군장병들의 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합당한 행사와 예우를 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긴 전쟁을 기억하고 습관화해야만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처럼 모든 국민이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하던 일손을 멈추고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참전용사에게는 존경과 예우를 표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그런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찬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