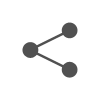올해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90년이 되는 해다. 39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엄동설한에 병자호란과 삼전도 굴욕의 아픈 역사를 몸소 겪어야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삼전도의 굴욕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겨야할 것이다.
1636년(인조 14) 음력 12월 추운 겨울. 청나라 황제 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쳐들어 왔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다. 청군은 12월 2일 심양을 출발하여 12월 8일 압록강을 건너고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을 거듭하여 5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소식을 듣고 우왕좌왕하던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서둘러 강화도 피난길에 나섰지만 청군의 선발대가 양화진 방면으로 진출하여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도 끊어져 버렸다. 인조 일행은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12월 15일이 되자 남한산성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군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인조와 대신들은 군사력을 모으고 일전불사의 항전태세를 취하려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추위에 식량은 떨어지고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증원군과 군수물자 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인조는 항복할 결심을 한다.
인조는 45일 만인 1637년 1월 30일 성을 나와 삼전도(지금의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서 청태종 에게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이날 삼전도에서는 조선 왕조의 존엄이 무너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치른 날이다.
삼배구고두례는 세 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세 차례 머리를 땅에 찧는 의식이다. 형식상 예를 갖춘 항복 의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이 군신 관계로 편입되었음을 천하에 선언하는 정치적 굴복이었다.
인조대왕은 흙바닥에 이마를 찧었고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 진실은 지금도 석촌호수 둔덕에 서있는 ‘삼전도비’가 말해주고 있다.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상 아니 우리 역사 전체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던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이기에 국왕, 신하, 백성 모두가 충격이었고 참담한 패배의식에 빠졌다.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야 했다.
또 수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등 패전국의 아픔을 톡톡히 겪게 되었다. 노예시장에 팔려갔다 돌아온 여성들은 수치스러운 ‘화냥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멸시받으며 살아가야 했다.
삼전도의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 위정자들이 중심을 잃는 순간 인간의 존엄은 지켜질 수 없고 외교는 힘을 기반으로 할 때만 결실을 맺는다.
힘이 없는 국가는 원칙을 말할 수 없고 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객원기자 안찬희>